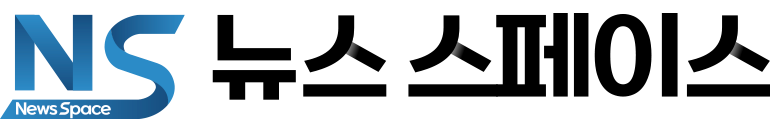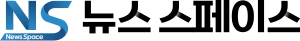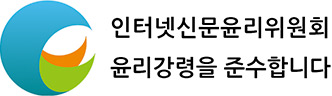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사내대출 제도가 ‘부동산 규제 우회 통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삼성,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두나무 등 유수의 기업들은 직원 복지 수단으로 사내대출 한도와 금리를 대폭 상향·인하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두나무는 최근 집값 안정 대책에도 불구, 사내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금리 역시 무이자에 가깝게 운용해 ‘역대급 복지’ 논란의 중심에 섰다.
DSR·LTV 적용 없는 사내대출, 실제 규모 5년 새 63% 급증
사내대출이 ‘근로복지기금’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은 돈줄이 막힌 실수요자들에게 큰 매력이다. 회사가 직접 대출을 시행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권 규제와 관계없이 한도 산정이 자유롭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실제 2020년 연간 대출액은 2조원대에서 2023년 3조392억원까지 63%나 늘었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상위 7개 기관의 사내대출 잔액도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국내 대표적인 사내복지가 우수한 회사별 사내대출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다.
두나무: 최대 5억원, 무이자
SK하이닉스: 최대 2억원, 1.5%
네이버: 최대 2억원, 이자 1.5% 지원(최대 10년)
카카오: 최대 1.5억원, 2% 초과 이자 지원
현대자동차: 최대 1억원, 2.0%
캠코 등 공공기관: 1억~1.6억원, 3.3% 또는 기준금리+0.73% 등 변동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4.2%(2025년 10월 기준)임을 고려할 때, 사내대출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해외 복지 비교와 제도적 의의
해외 글로벌 기업도 복지의 일환으로 저리 사내대출 또는 복지기금 대출을 시행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도나 대상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글로벌 IT기업에서는 몇년 이상 근속자에게 연간 수백만원 수준의 선택 복지를, 또는 며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은 현금성,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규제 역차별 및 정책적 논란
반면, 사내대출이 DSR 등 각종 금융규제의 무풍지대로 작동하면서, "대기업·공공기관 고연봉자 등에만 대출 특혜가 집중된다"는 역차별 비판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 경우 2021년 정부 지침에도 불구, 최대 1억원 초과(캠코 1억6000만원) 대출이 저리(3.3%)로 실행돼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사내대출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규제 우회’라는 지적과 함께, 서민과의 금융 접근성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한 임원은 "일반 직장인과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금융대출받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가 높아 부담이 크다"면서 "하지만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를 피한다는 건 같은 국민으로서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 인재 확보, ESG까지…사내기금의 다층적 진화
최근 국내 기업들은 복지기금 운영을 통해 인재 유치, 장기근속, 조직 안정은 물론 세무 전략, 기업 가치 제고까지 다각적 효과를 노린다.
기금 지원액은 대기업 기준 수백억~수천억원대로 집계되고, 정부 또한 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비용의 최대 50%, 연간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선택적 복지, 가업승계, 사회적 책임(ESG) 경영 등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