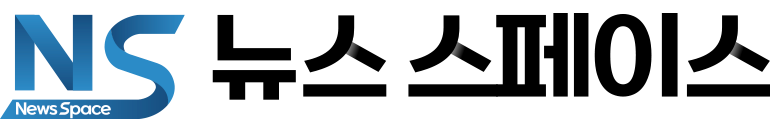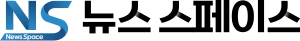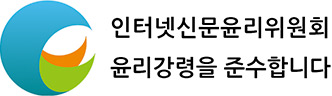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2020년부터 본격화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4년이 지난 현재, 국내 대기업들의 ESG위원회 설치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운영 실태를 살펴봐도 회의는 분기 평균 1회도 안 열렸고, 회의당 안건 수도 2.3개에 그쳤으며, 그 중 60% 이상이 단순 보고에 그쳤다.
수년간 재계를 강타했던 ESG 열풍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1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361개사를 대상으로 ESG위원회 및 유사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53.7%인 194개 기업만이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준 조사에서 48.5%(175개 기업)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동안 19개 기업 증가에 그친 수치다.
ESG위원회를 운영하는 194개 기업에서 지난해 열린 회의는 총 595회로, 위원회당 연평균 3.8회에 불과했다. 분기당 1회도 개최되지 않은 것이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1361건으로, 회의당 평균 2.3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이 중 64%에 해당하는 875건이 단순 보고였으며, 가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은 35.7%(486건)에 불과했다.
ESG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486건의 안건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로 분류해 본 결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79건으로 전체의 16.3%에 그쳤다. 나머지는 ESG 관련성보다는 기업 전략이나 주주환원 등의 기타 안건이 대부분이었다.
직접 안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E) 관련이 39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지배구조(G) 개선 23건(4.7%), 사회(S) 관련 17건(3.0%) 순이었다.
업종별 ESG위원회 설치율을 보면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지주사들과 이동통신 3사는 100% 운영 중이었다. 이어 500대 기업에 포함된 공기업 10곳 중 9곳(90%)이 ESG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조선·기계·설비업 70%, 증권업 70.0%, 상사업종과 생활용품 66.7%, 서비스업 6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철강업(21.4%)과 제약업(25.0%)에서는 ESG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업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철강업의 경우 14개 기업 중 3곳이, 제약업은 8개 기업 중 2곳만이 ESG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ESG위원회를 운영하는 194개 기업에서 활동하는 위원은 총 624명이었으며, 이 중 78.4% 489명이 사외이사였다. 사내이사는 21.8%(136명)에 그쳤다.
위원장이 지정된 ESG위원회는 96곳에 불과했으며, 그보다 더 많은 98곳은 위원장이 없거나 공시되지 않았다. 또한 위원장이 있는 96곳 중 사내이사가 위원장을 맡은 경우는 단 5곳뿐이었다. 오뚜기 황성만 대표이사 사장, 롯데렌탈 최진환 대표이사 사장, 농심 이병학 대표이사 사장, F&F 김창수 대표이사 사장, 에쓰오일(S-oil)의 모타즈 알 마슈크(Motaz Al Mashouk) 기타비상무 이사가 그들이다.
나머지 91곳은 사외이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사내이사가 ESG위원장을 맡은 비율(7.7%, 12명)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