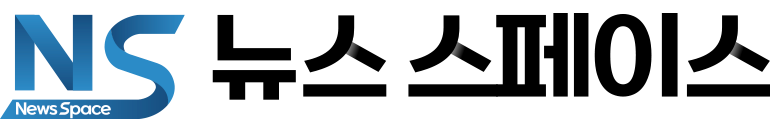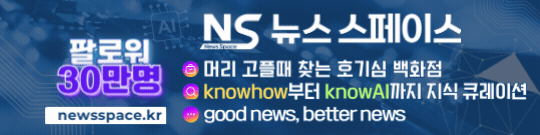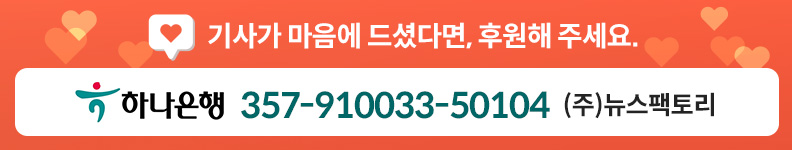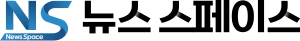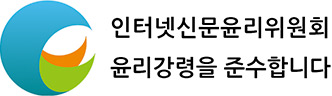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테슬라가 호주에서 첫 우핸들 시장에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Full Self-Driving Supervised, FSD)’ 기술을 공식 출시하며 자동차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테슬라 공식 발표, The Driven, Teslarati, The Conversation, The New Daily, Australian Government Transport Reports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식 발표 후 9월 중순 현재 호주 전역의 초기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한 이 시스템은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며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퍼스 거주자 Gareth H가 공개한 야간 주행 영상 등에서는 FSD가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30일 무료 체험 서비스도 신규 구매자에 한해 제공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법적 불확실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멜버른 중심업무지구(CBD)에서 운전자의 손이 스티어링 휠에서 떨어진 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영상이 공개된 후, 빅토리아주 교통 및 계획부는 해당 테스트에 대한 승인 사실을 부인하며 “멜버른 CBD 내 완전자율주행 차량 시험을 승인한 바 없다”고 밝히며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 내 자동차 자율주행 규제는 현행 기준상 레벨 2 자동화를 허용하지만, 완전자율주행 수준인 레벨 3 이상은 별도의 허가제이다. 테슬라의 FSD 슈퍼바이즈드는 국제 SAE 기준상으로는 레벨 2에 해당하나,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스윈번 대학교 후세인 디아 교수는 “이 시스템은 고급 학습 운전자와 같으며, 법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며 “실제 도심 테스트 영상에서 운전자의 손은 휠 근처에 있지만 닿지 않은 상태로, 이는 일반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지 테슬라 오너스 클럽 대표 피터 손은 이 시스템이 시드니의 복잡한 도로망, 로터리 및 교차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사용자들이 빠르게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 라이언 코완은 호주 도심 고속도로에서의 운행 경험을 “성능에 감동해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전했으나, 멜버른의 독특한 후크 턴(hook turn)에서는 수동 운전 개입이 필요함도 확인됐다.
법학 전문가인 찰스 다윈 대학교의 마크 브래디 박사는 “자동차 사고의 94% 이상이 인간의 실수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 안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초기 적응 기간에는 기술과 사람의 공존으로 인해 사고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통합 법안 ‘Automated Vehicle Safety Law’를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 기업에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2024년 중반 공청회를 마친 상태로 최종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달리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관행과 차별화된 정책이다.
기술적으로 FSD는 현재 하드웨어 4(Hardware 4)가 장착된 모델 3과 모델 Y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되고 있으며, 기존 하드웨어 3 사용자에 대한 무상 업그레이드도 약속했다. 테슬라는 향후 우핸들 시장에 보다 광범위하게 FSD 슈퍼바이즈드를 보급할 계획으로, 호주가 전 세계 우핸들 차량 최초로 이 첨단 기능을 도입한 국가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호주의 도로 안전 현실은 심각하다. 2024년 호주 전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303명에 달하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공유 및 도로 안전 정책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테슬라 FSD의 도입이 이 같은 통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번 호주 출시 사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규제의 긴장 관계를 극명히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첨단 기술의 편리함과 안전성에 주목하지만, 법적·사회적 시스템은 이 새로운 운행 방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수용할지 고민 중이다.
테슬라의 ‘슈퍼바이즈드’ 자율주행은 미래 자동차 운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되, 현행 법규에 의거한 운전자 감독 의무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