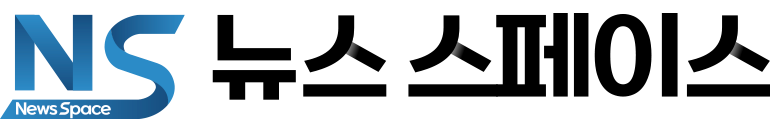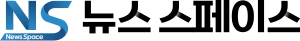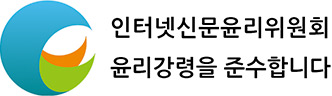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미국 메이저 투자은행(IB)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100대 글로벌 기업을 선정했다.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100(Humanoid 100)’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기업인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를 비롯해 BYD·알리바바·토요타·텐센트·샤오미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삼성전자, 삼성SDI), 현대자동차, LG(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가 글로벌 로봇 분야 100대 핵심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빅테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보고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크게 ▲브레인(반도체 개발) ▲바디(하드웨어 제작) ▲인테그레이터(통합형) 3개 부문으로 분류,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상장 기업 100개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브레인 영역은 AI 칩, 소프트웨어, 반도체를 포함하며, 로봇의 지능형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바디 영역은 센서, 배터리, 전기 모터, 하모닉 드라이브 등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또 인테그레이터 영역은 완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주로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술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Body"를 주도하고, 엔비디아는 "Brain"을 목표로 하며, 테슬라는 "Integrator"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참여한 기업의 73%, 통합형 모델의 77%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이 중 56%와 45%가 각각 중국에 속할 정도로 로봇 분야에서 중국의 선전은 엄청난 수준이다.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에서 6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휴머노이드 바디" 부문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로봇 공급망에서 우수한 지위를 확보한 이유는 막강한 노동력 비용 우위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빅테크들은 각자가 보유한 강점을 앞세워 해당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용 AI 칩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으로 옴니머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FSD(Full Self-Driving) 알고리즘을 통해 로봇 공학으로 변신을 가속하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최근 실적발표회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업적으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10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 아담 조나스와 윌리엄 J. 타케트 애널리스트는 "향후 10년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술 투자에서 가장 큰 테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총 잠재 시장 규모(TAM)가 60조 달러(8경662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2035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BCC는 세계 로봇 전체 산업 규모가 2029년 말 1650억 달러(약 242조2000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발언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엄청난 잠재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챗GPT의 순간'을 맞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내 기업 가운데 브레인 부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디 부문에는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인테그레이터(통합형) 카테고리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2024년말 국내 대표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보 랩(Lab)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 전문기업이다.
현대차는 로봇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020년 12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 80%를 인수했다.
네이버는 제2사옥 ‘1784’의 로봇 친화형 건물 인증을 획득하고 사옥 내에 서비스 로봇 ‘루키’ 10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우선 브레인(Brain) 영역에는 22개 기업이 포함됐다. 브레인 부문은 주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자율성을 위한 생성 AI 모델, 시뮬레이션 모델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핵심 요소다.
대표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알파벳, 마이크론, 팔란티어,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암(Arm), 시놉시스(Synopsys)와 같은 칩 설계 회사가 주요 기업으로 언급됐다.
중국 기업으로는 바이두와 호라이즌 로보틱스가 시각 칩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의 센서, 배터리, 전기 모터, 하모닉 드라이브, 배선 및 커넥터 네트워크, 리튬 이온 배터리 등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담당하는 바디(Body)영역에는 64개 기업이 포함됐다.
테슬라의 옵티모스(Optimus) Gen2는 50개의 자유도를 구동하기 위해 28개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할 정도로 액추에이터(스크류, 하모닉 드라이브, 전기 모터, 센서, 베어링, 엔코더로 구성) 기술영역은 급부상중이다. 이 분야에서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와 중국의 Jiangsu Hengli Hydraulic이 공급망에 포함됐다.
특히 보통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로 로봇 몸통 중앙부에 설치되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CATL(중국)과 LG에너지솔루션(한국)이 주요 공급업체로 예상됐다.
인테그레이터(통합형) 영역에서는 22개 기업이 포함됐다. 완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주로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술 대기업이 포함된다. 테슬라, 현대차(보스턴 다이내믹스), 토요타 등의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애플, 샤오미, 소니 등의 소비자 전자 회사들이다. 여기에는 알리바바, 아마존, 텐센트 같은 전자상거래 기반의 인터넷 회사들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