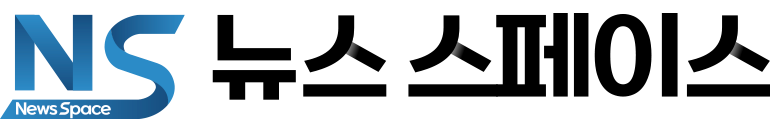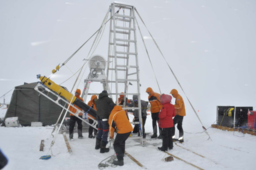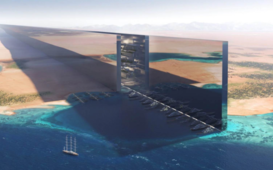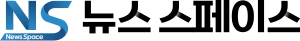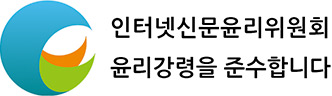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2014년 시베리아 야말 반도에서 갑작스러운 지하 폭발로 얼음과 흙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분화구 현상은 당시 지질학적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11년이 흐른 현재, 과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20여개 이상의 분화구 현상 뒤에 숨겨진 물리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즉 북극 온난화가 이 지역 툰드라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The New York Times, AGU Press Release, Nature Climate Change, Gizmodo, 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따르면, 오슬로대 헬게 헬레방 교수팀은 러시아와 영국의 현장 자료를 종합하고 고해상도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발견한 자료만으로는 깊이가 45미터에 달하는 대형 분화구들이 분출한 막대한 잔해량을 설명할 수 없었다.
대신, 지하 단층을 따라 상승하는 심층 열과 메탄 가스가 ‘크리오펙(cryopegs)’이라 불리는 영하에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염수층 아래에 집중되며, 계절별 융해수가 침투하면서 압력 역전과 함께 영구동토가 균열되고 터져 나가는 ‘터진 샴페인 뚜껑’ 현상이 발생한다고 결론지었다.
북극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4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대 탄소 저장고인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고 있다. 2025년 1월 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미 북극-보레알 지역의 30~40%가 성장기 동안 순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됐고, 특히 메탄 배출은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지녀 지역 해빙의 피드백 루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 폭발 현상은 야말과 가까운 기다 반도에도 확대되고 있으며, 폭발 전 10여년간 서서히 진행되는 압력 변화가 심층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분해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폭발적인 메탄 방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과정이 삼투압에 의해 크리오펙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지하 균열이 표면까지 연결되고, 갑작스런 압력 강하가 폭발을 촉발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아직도 단층에서 발생하는 심층열과 가스만으로 모든 폭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표면 가까이에서의 가스 축적 혹은 크리오펙 내 삼투압 작용이 보다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관측 센서가 부족한 외딴 지역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 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헬레방 교수는 “폭발은 드문 현상이지만, 점차 더 많은 구역에서 깊은 빙결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이 툰드라 지대의 지반과 생태계 변화는 한 분화구씩 시작돼 전체 북극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기후 변화가 불러온 심각한 지질·생태학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며, 북극 영구동토 해빙과 메탄 방출 증가가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는 중요한 경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