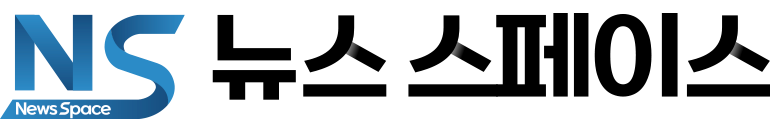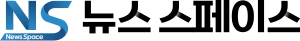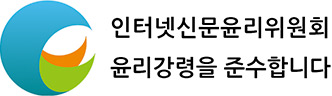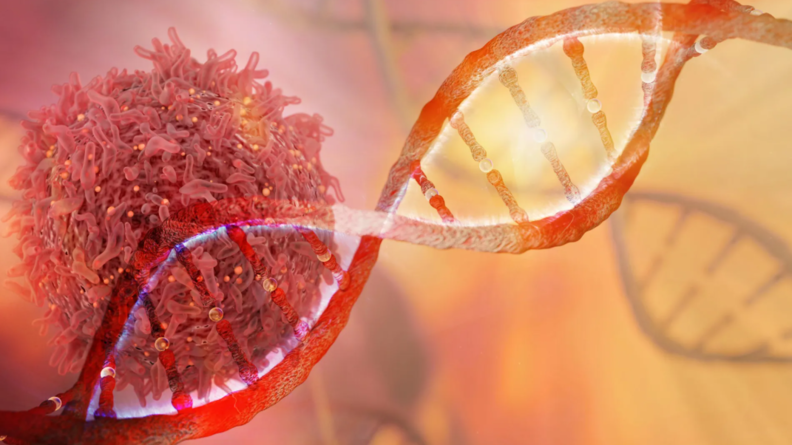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전 세계 인구 약 10억명이 비타민 D 결핍을 겪고 있고, 매년 약 190만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장암의 치료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유전자의 발견이 의학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다수의 국제연구 결과에 따르면, SDR42E1이라는 유전자가 비타민 D의 흡수와 대사, 그리고 암세포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인자로 밝혀졌다. 특히 이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암세포의 생존율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가 도출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Science Daily, Medical Dialogues 등의 매체들이 보도했다.
SDR42E1: 비타민 D 흡수를 좌우하는 숨은 조력자
SDR42E1(SDR family member 42E1)은 단쇄 탈수소효소/환원효소(SDR) 초과가족 유전자로 분류되며, 주로 장에서 비타민 D의 흡수를 돕고, 활성형인 칼쉬트리올(calcitriol)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美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가 제공하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SDR42E1은 인간의 여러 조직에서 발현되며 특히 점막 조직과 소화관에서 높은 발현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RISPR/Cas9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최신 연구(Frontiers in Endocrinology, 2025년 6월호)에서는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통해 비활성화될 경우,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단백질이 생성되어 비타민 D의 대사 경로 전체가 마비되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는 일부 인구가 충분한 햇빛 노출이나 보충제를 섭취하고도 여전히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을 겪는 생리학적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다.
진화적으로도 ‘핵심 유전자’…선충부터 초파리까지 보존
흥미로운 점은 SDR42E1 유전자가 유인원부터 선충(Caenorhabditis elegans), 초파리(Drosophila melanogaster) 등 다양한 생물종에 걸쳐 진화적으로 강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SDR42E1이 단순한 인간 유전자에 그치지 않고, 생명체 전반의 스테롤 대사 및 피부 내 비타민 D 합성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관련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연구(PMC11387231)에 따르면, SDR42E1 단백질은 비타민 D₃, 7-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 8-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 등과 강한 결합 친화성을 보이며 피부 내 합성 경로에서도 중요한 보조 인자로 작용한다.
암세포 생존율 53% 급감…정밀 종양치료의 신호탄
이번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SDR42E1을 비활성화했을 때 대장암 세포(HCT116 라인) 생존율이 53%까지 감소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CRISPR/Cas9 기법으로 SDR42E1 유전자를 제거한 뒤, 단백질체 및 전사체 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 무려 4,600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발현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주요 유전자 변화를 살펴보면, LRP1B, ABCC2 발현은 증가했으며 WNT16, SLC7A5 발현은 감소했다. 이는 세포 성장과 대사에 핵심적인 경로들이 SDR42E1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암세포 대사에서 관여하는 알돌레이즈 A(ALDOA) 단백질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도 확인됐는데, 이 단백질은 포도당 대사와 암세포 에너지 생성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한편, SDR42E1을 다시 인위적으로 과발현시켰을 경우 이 효과는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는 세포 생존력을 회복시키는 반응성 역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Frontiers in Endocrinology, doi:10.3389/fendo.2025.1585859).
치료에서 응용까지의 과제…그러나 분명한 '전략 타깃'
이같은 SDR42E1의 선택적 효과는 향후 정밀 치료전략(precision oncology)에서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맞춤형 치료법’의 중요한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 아직은 전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인간 대상 임상시험과 독성평가, 장기 안정성 평가 등의 후속 작업이 필수적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자 기반 정밀 치료법의 성공 가능성은 질병의 유전자 의존도(Gene Dependency)가 높을수록 확실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SDR42E1처럼 특정 질환(대장암)과 밀접하게 연관된 유전자는 임상 성공률이 기존의 화학 항암제보다 최대 2.3배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2024년 9월호).
전문가 “비타민 D 문제를 품은 암의 새로운 키를 찾았다”
서울아산병원 면역내과 오진환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한 유전자 기능 발견을 넘어서, 고질적인 비타민 D 결핍 문제와 암의 생물학적 의존성을 동시에 풀어나갈 열쇠 역할을 한다”며 “특히 기존 약물에 내성을 보였던 대장암 환자에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SDR42E1 유전자는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생체 내 대사와 암발생, 면역 조절에 걸쳐 있는 생명유지 조절자의 정점에 가까운 유전자다. 향후 이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약물이나 유전자치료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암은 물론 루푸스, 크론병 등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