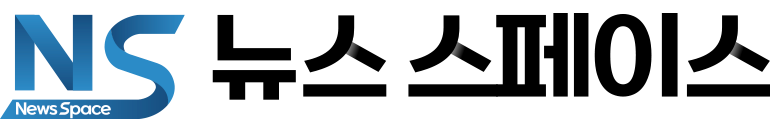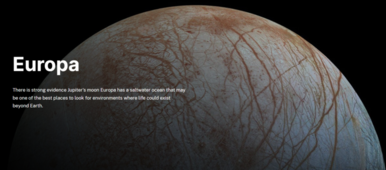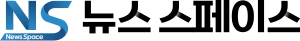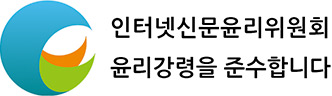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한국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2035년까지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며,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6월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브라운백 미팅’에서 공개된 이번 사업 변경안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재사용발사체 상용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글로벌 우주수송 패러다임, ‘재사용’이 표준 된다
재사용발사체는 한 번 쏘아 올린 로켓의 일부(주로 1단)를 회수해 다시 사용하는 기술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발사 빈도를 높일 수 있어 우주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이미 재사용발사체 상용화에 성공하며 우주수송 비용을 대폭 절감했고, 이를 계기로 중국, 유럽, 러시아, 일본, 인도 등 주요 우주 강국들도 앞다퉈 재사용발사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민간기업 주도로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재사용발사체 기술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러시아, 일본, 인도 등도 자체 발사체를 바탕으로 재사용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2030년대 전후를 목표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일정을 앞당기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2032년 개발에 성공해야만 경쟁에 합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한국의 전략적 전환…사업 일정·예산·기술 모두 ‘재정비’
우주청은 최근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방향을 ‘재사용’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기존 일회성 발사체 중심에서 재사용 체계 별도 개발, 조기 재사용화 개발로 전환하면서, 2032년부터 연간 2회, 이후에는 연 3회 발사가 가능한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르면 2034년부터는 1단 바지선 귀환 등 본격적인 재사용 완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첫 시험호기 발사는 기존 2030년에서 2031년 말로 연기됐지만, 2·3차 발사는 2032년으로 앞당겨 달 착륙선 발사 목표를 유지한다. 2032년에는 1단 엔진을 활용한 호핑 테스트(수직 이착륙 실증)도 병행한다. 3차 발사까지는 달 착륙선 수송 등 일회성 임무로 진행되나, 이후에는 상업발사와 1단 귀환 시도 등 본격적인 재사용 기술 실증에 나선다.
이러한 일정 변경과 기술 고도화에 따라 사업 예산도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98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와 국가우주위원회 승인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골든타임’ 놓치면 우주산업 진입장벽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재사용발사체 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모든 나라들이 2030년대 전후를 목표로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 항공기 완제품 시장처럼 시기를 놓치면 우주산업 진입장벽이 굳어진다”며, 조기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순영 재사용발사체프로그램장 역시 “2032년부터 연 2회, 이후 3회 발사가 가능해지면, 2034년부터는 우주수송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사용발사체 상용화는 우주수송 비용 절감과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의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만약 개발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남아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조기 재사용화에 성공하면, 한국은 우주수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
‘2035년 재사용발사체’는 한국 우주산업의 생존 전략
우주항공청의 이번 사업 개편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우주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생존 전략’이다.
스페이스X 등 선도 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미래 우주수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기 재사용발사체 개발과 상용화가 필수적이다. 향후 예산 증액과 정책적 지원, 기술개발 가속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2030년대 초반, 재사용발사체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주산업 주도권은 영영 남의 것이 될 수 있다.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재사용발사체 개발의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