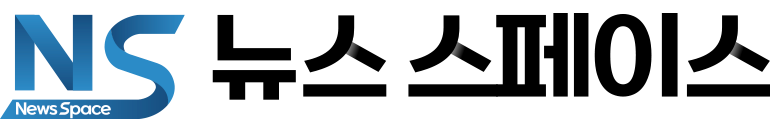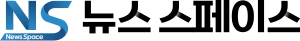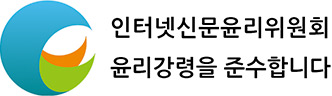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20년 만에 내 이름을 직접 쓸 줄 몰랐다. 평범한 삶의 가치를 되찾아가고 있다.”
2025년 7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오드리 크루즈(36)가 인류 최초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칩을 이식 받고, 20년 만에 본인의 이름을 ‘생각만으로’ 컴퓨터 화면에 쓰는 데 성공했다.
2005년 교통사고로 척추손상 후 완전마비(사지마비)에 빠진 그가 2025년 7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Neuralink)의 임상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자율성을 얻었다고 The Sun, Times of India, MIT Technology Review 등의 매체들이 보도했다.
임상시험의 역사적 순간… “나는 이 수술을 받은 세계 최초의 여성”
오드리 크루즈는 뉴럴링크의 ‘프라임(PRIME) 임상시험’에서 ‘P9’(환자 9번)으로 불린다. 2025년 7월 미국 마이애미 소재 병원에서 BCI 칩을 두개골 내 운동피질에 이식하기 위해 두개에 1달러 동전 크기의 구멍을 뚫고, 128개의 초극세 전극을 삽입했다. 수술은 로봇이 고도의 정밀도로 시행했다.
이 칩은 뇌의 운동 신호를 실시간 해독, 무선 신호로 외부 컴퓨터에 전달해 커서 이동, 입력,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오드리는 “검지손가락으로 클릭한다고 상상하고, 커서를 손목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실제 컴퓨터에서 동작이 실현된다”며 “물리적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평범하게 ‘텔레파시’로 일상을 산다”고 밝혔다. 그간 그는 컴퓨터 화이트보드 앱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써보고, 사과, 나무, 하트, 고양이 등도 그려 전 세계에 그 모습을 공개했다.

BCI 기술의 구조와 성과… “디지털 독립성, 일상으로 들어오다”
뉴럴링크의 N1 칩은 두개골 내 삽입형으로, 뇌 운동피질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를 128채널의 전극이 즉시 포착한다. 칩은 완전 무선·충전식이며,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다. 신호는 알고리즘으로 해석돼 커서 조작·클릭·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디지털 인터랙션에 가능성을 연다.
단, 현재 단계에서는 신체 근육이나 감각 회복(재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오드리 역시 “이 칩만으로 걷거나 근육운동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다. 순수하게 생각만으로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는 ‘테크-텔레파시’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2025년 현재 뉴럴링크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승인을 거쳐 7명 이상의 전신마비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환자들은 대부분 20~30여년 심각한 마비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뉴럴링크 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25여 건의 BCI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등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최근 BCI 장치의 뇌신호 명령 해독 정확도는 평균 77~83%에 이를 만큼 고도화되고 있다. 반복학습 시 해독속도도 크게 단축되는 등 사용자의 적응성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경제·사회적 파장… 6.5억달러 투자, ‘디지털 독립’의 희망
뉴럴링크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상용화 및 글로벌 임상확대를 위해 2025년 6월까지 6억5000만달러(약 8400억원) 이상을 신규 유치했다. FDA에서는 ‘말하기 복원’ 및 ‘시력 회복용’ 칩에 연이어 혁신기기 지정(Breakthrough Designation)을 부여하는 등, 기술의 사회적 파장과 미래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BCI 기술은 5000만명에 달하는 전 세계 중증마비·실어증 환자 등에게 ‘디지털 자립’과 소통의 장벽을 혁명적으로 허물 잠재력이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 임상환자의 약 70~85%가 제한적 컴퓨터 조작, 일부 환자는 간단한 문장 입력 등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달성했다는 보고도 있다.
향후 전망… “모든 한계를 넘는 테크휴머니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임상적 한계와 윤리, 사회적 논란 역시 여전하다. 하지만 오드리 크루즈(P9) 사례는 인류가 ‘생각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문명을 향해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다.
오드리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생각만으로 조작하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 자신의 일상과 BCI 기술 확산을 꾸준히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