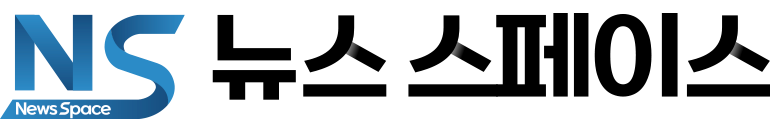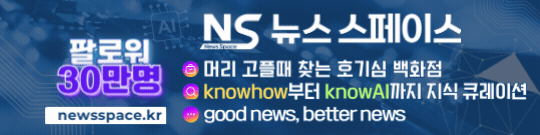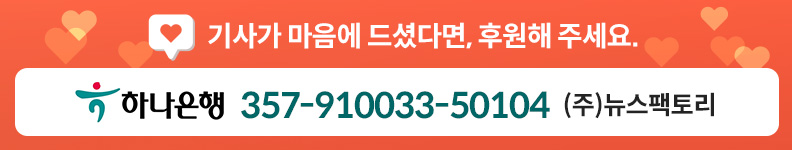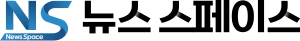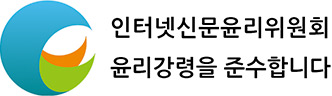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국내 판매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이 공개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공개 대상 유해 성분 44종의 목록은 1997년 미국 암예방연구소의 디트리히 호프만 박사가 담배 연기에서 확인한 성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대 담배 내 포함된 7000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공개 방식
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 판매업체는 3개월 내에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이러한 검사를 반복해야 한다.
새로 출시되는 담배 제품은 판매 개시 후 한 달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결과를 2026년 말부터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궐련형 일반 담배(전자 담배 포함) 44종, 액상형 전자 담배 20종이 대상이며, WHO와 ISO가 권고하는 검사 유해 성분보다도 더 많은 수치를 검사·공개하게 된다. 예컨대 WHO는 20종, ISO는 28종을 검사하고 있으나 국내는 캐나다와 동등한 44종으로 확대하였다.
실효성 논란과 규제 공백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30년 전 기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많이 판매되고 있는 합성 니코틴 담배는 국내 법체계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한정돼 있어 검사·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성 니코틴 제품은 건강 유해성 자료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또한 ‘무(無)니코틴’ 유사 전자담배도 공개 대상에서 배제되어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국민 알 권리 vs 오해 가능성
유해 성분 수치 공개가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공개 정보가 특정 성분의 단순 나열에 머물러 흡연자 사이에 ‘덜 해로운 담배’ 선택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과 발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병행돼야만 ‘국민 알 권리’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구현된다고 평가한다. 식약처도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방법에 대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제 기준과 비교
WHO의 담배 규제 지침(FCTC)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가지 화학물질과 70여종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국은 이 중 핵심 유해성분에 대해 엄격한 검사와 공개를 진행 중이다. ISO도 담배 성분 시험의 국제 표준을 마련해 검사법과 수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국내 법규도 국제 트렌드에 발맞춰 점진적 확대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이번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건강권 보호와 정보 공개라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그러나 변화하는 담배 시장 환경과 확대된 규제 필요성에 비해 아직 ‘과거 잣대’에 머무른 점과 규제 미비 부분이 분명해 후속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