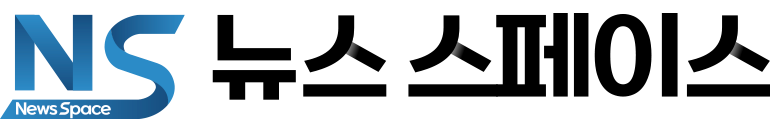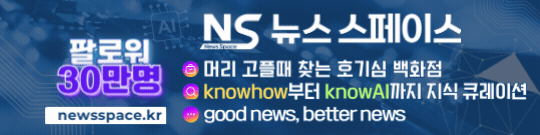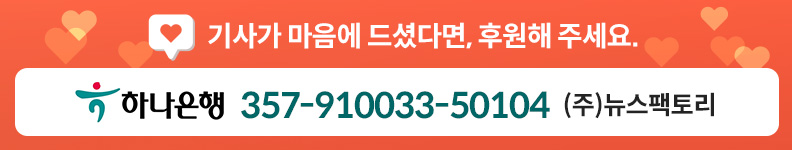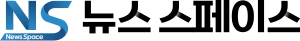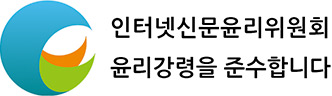간만에 제대로 된 명품을 만난 기분이다. 지지고 볶고 울고 웃기며 카타르시스를 주는 볼 만한 드라마는 많았지만, 이 작품은 그 이상의 것을 건드렸다. 등장인물의 독백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와 닿았고, 문화 사대주의는 아니지만 원작이 해외에 있어 그런지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느꼈다.
배경이 어떻고 연출이 어떻고 볼거리가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이 드라마의 힘은 훨씬 단단한 곳에 있다. 가족의 ‘해체’가 전성시대인 지금, 가족의 ‘결합’을 담백하면서도 묵직하게 보여준 데 있다. 이게 이 작품을 명품으로 만드는 이유다.
이제는 1인 가구가 하나의 가구 형태로 당당히 인정받는 시대다. 나아가 반려견과 반려묘도 법적 구성원은 아니지만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 즉 또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
극 속 인물 구성은 그야말로 현대 가족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어느날 갑자기 맞이한 미혼부, 사회적 지위는 의사지만 그 미혼부를 사랑하게 된 외로운 여자, 백수와 취업을 오가는 여자의 답없는 동생, 그 동생을 짝사랑하다 스타작가의 반열에 오르는 여사친,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 후 다시 영화처럼 사랑을 만났지만 결국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여자의 연인이 아버지. 그리고 그 아이(생물학적으로는 아들도 아니었다), 원래 부인의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까지.
이처럼 얽히고설킨 이들은 어찌 보면 모두 남남이고, 실제로도 남남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웃는 순간, 다시 가족이 된다. 조인성이 한 영화에서 던졌던 명대사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식구가 뭐야? 한 입으로 밥 먹는 사이 아녀?” 참 간단하지만 묵직한 정의다.
◆ 헤어짐과 분열의 시대에 건넨 통찰
집 하나를 두고도 가족은 의견이 갈린다.
“아빠가 샀으니 아빠 거냐? 같이 살고 자란 우리는 뭐냐.”
“언니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서 저 여자랑 이러고 있어요…”
팔기로 했던 집, 아니 지워버리려 했던 공간이 다시 모두를 불러 모아 숨 쉬게 한다. 있는 집을 팔아 ‘똑똑한 한 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시대, 집이 삶의 공간이 아니라 재테크의 제1번 수단이 되어버린 지금, 마당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머릿속을 오래 맴돈다.
혼밥·혼술·혼영이 어색하지 않은 지금, 이 드라마는 함께·같이·모두를 조용히 외친다. 그래서 매회 공감했고, 감정이 이입돼 울었고, 결국 넷플을 떠나 금요일 밤 본방을 찾아가며 마지막 회를 함께했다.
◆ 같지 않지만 함께하는 마음, ‘공감’
코칭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다. 코치는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종종 ‘같은 마음’을 먹으려 애쓴다. 하지만 타인이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더구나 고객도 그걸 바라지 않는다.
중요한 건 ‘동감’이 아니라 ‘공감’이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처럼,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절실해진 존재처럼. 코치가 공감의 자세로 임할 때 비로소 고객은 마음을 열고 알찬 코칭이 이어진다.
12화 최종회가 그렇게 끝났다. 아쉽지만 아름다운 마음이 남았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며 졸문을 마친다… (to be continued)
p.s. 아이돌로 시작했다 연기돌로 우뚝선 서현진. 그녀의 재발견같다. 이 배우의 표정과 대사 하나 하나가 좋았던 작품이다. 여럿 배우를 닮은 느낌인데 미혼부의 원래 연인이었던 그 아들의 엄마역할분은 누구지. 작품을 잘 만나면 더 알려질 것 같은 예감이다.
* 칼럼니스트 ‘올림’은 건설,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소재·화학, IT, 패션 등 다양한 업계를 거쳐온 홍보전문가입니다. 인증코치이기도 한 그는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미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