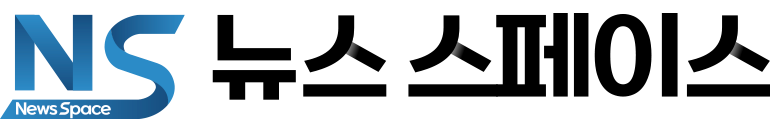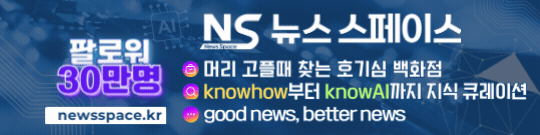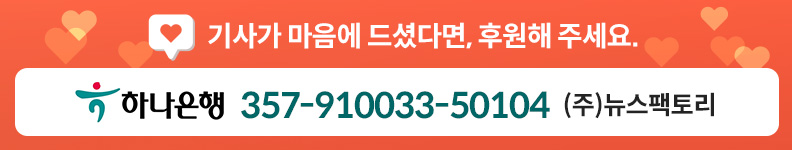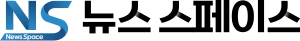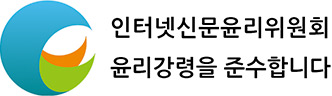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반려견’, ‘반려묘’
언젠가부터 일상에서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다. 예전에는 “강아지 키우세요?”, “집에 고양이 있어요?” 정도의 표현이 전부였다.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전제하는 언어가 채택되고 있다.
‘반려(伴侶)’의 어원을 다시 찾아보니, 짝 반(伴)과 동무 려(侶). 즉 짝이 되어 함께 지내는 존재, 삶의 파트너라는 뜻이다. 1인 가구가 일반화된 시대에 ‘반려’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모든 존재를 향한 호칭이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넷플릭스에서 헤매다 오랜만에 쿠팡플레이를 열었다. 여러 작품을 넘기다 눈에 들어온 영화가 <컴패니언(Companion)>. SF와 스릴러가 결합된 장르라는 설명에 호기심이 동했고, 런닝타임도 부담이 없었다. (*제가 좋아하는 120분 미만)
◆ 프로그래밍된 반려는 유익하기만 할까
영화의 설정은 철저히 인위적이다. 자신이 로봇임을 모르는 로봇, 그와 관계를 맺는 인간, 그리고 둘 사이의 정서적 착시. 처음에는 ‘반려봇’으로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였으나, 설정값의 오류와 인간의 욕망이 개입되면서 시스템은 빠르게 일탈한다. 완벽해 보였던 동반자 관계는 곧 사고와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파국을 맞는다.
만약 애초에 정해진 역할 내에서 ‘반려’로만 존재했다면 문제는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에 의해 변조되고 악용될 위험을 품는다. 이 영화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린다.
잠시 시선을 코칭으로 돌려보자. 코칭도 일정한 문법을 갖는다. 아이스브레이킹 → 관계 설정 → 심화 탐색 → 격려와 실행. 한정식 코스처럼 단계가 있다. 이 과정을 수용하는 고객을 만났을 때 코칭은 큰 시너지를 낸다. 반대로, 문법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경우 코칭은 종종 실패한다. 설정값을 벗어난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영화 속 반려봇과 크게 다르지 않다.
◆ AI에서 AGI, 그리고 ASI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의 대중화 시대에 살고 있다. 특정 기능 중심의 AI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인공지능(AGI)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간 초인공지능(ASI) 시대는 더 이상 공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영화는 기술 발전이 초래할 가능성을 정면에서 묻는다. 단순히 보안과 윤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주도권의 문제, 즉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는가 기술이 인간을 이끄는가의 질문이다. 이는 <터미네이터>나 <혹성탈출>과 같은 상상 속 서사와 연결되지만,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보기 어렵다.
코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미 AI 코치가 등장했고, 일부 영역에서는 인간 코치를 대체하거나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 관계가 수평적 동반자에서 수직적 종속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는 ‘반려’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할 것이다.
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며 나는 때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경이로움과 불편함. 어린 시절 친구들과 흙먼지 날리며 놀던 시대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변화의 속도가 조금만 더 천천히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 종종 든다. 씁쓸하다…(to be continued)
p.s.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배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선하지 못하다고 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독립영화 특유의 감각과 여백 덕에 더 집중하며 봤다.
* 칼럼니스트 ‘올림’은 건설,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소재·화학, IT, 패션 등 다양한 업계를 거쳐온 홍보전문가입니다. 인증코치이기도 한 그는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미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