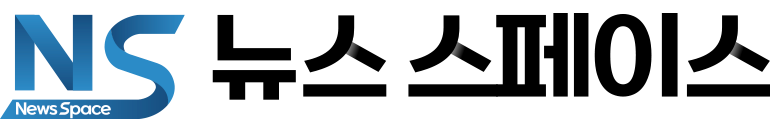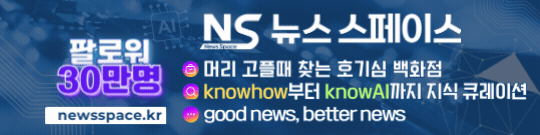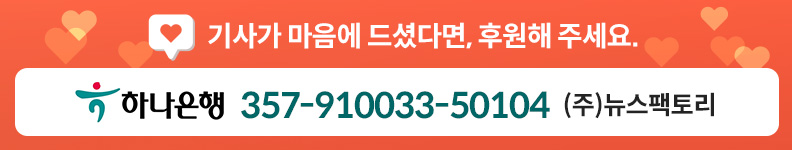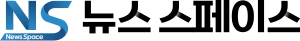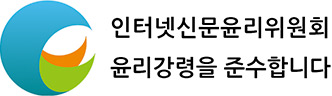인도행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내가 서 있게 된 곳은 갠지스강이 아닌, 사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변화관리 TFT 조직이었다.
이곳은 정식 부서가 아니었다. 본업은 따로 있고, 선발된 인원들이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일을 '더' 해야 하는, 일종의 '체인지 에이전트(Change Agent)' 팀이었다.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진심으로 해?"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내가 열심히 한 건, 일종의 오기이자 호기심이었다.
'좋은 마케팅은 고객의 지갑을 여는데, 좋은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 시절 나와 내 동료들은 자신만만했던 것 같다. 마케팅에서 배운 '브랜딩' 기법을 조직문화에 적용했다. 직원을 '내부 고객'으로 정의하고, 딱딱한 지시 대신 세련된 캠페인과 감각적인 이벤트를 기획했다.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행사는 화려했고, 직원들은 즐거워 보였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화려한 이벤트가 끝나면, 직원들은 다시 냉소적인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 앉았다. "행사 때만 좋았지. 근데 변한 게 뭐야?"라는 후일담이 들려왔다.
그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은 '제품'이 아니다. 예쁜 포장지로 감싼다고 해서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마케팅은 짧은 순간의 욕망을 자극해 '구매'라는 행동을 이끌어내면 성공이다. 하지만 조직문화는 달랐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일은 화려한 이벤트나 세련된 슬로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잠깐의 통증은 잊게 해주지만,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는 못하는 '진통제'와 같았다.
그렇게 나는 벽에 부딪혔다. 내 손에 쥐어진 '마케팅'이라는 무기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HR'의 영역에서는 너무나 가볍고 얄팍하게 느껴졌다.
"왜 저 팀장은 팀원들의 말을 듣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구성원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몰입을 통해 움직이게 만들까?"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WHY' 앞에서 나는 자주 멈춰 섰다. 그때까지 나는 커리어의 다음 단계로 MBA를 생각하고 있었다. 더 멋진 전략가가 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1년간 몸소 부딪혀 본 조직문화 활동이 안겨준 처절한 한계는 내 나침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기술(Skill)이 아니라, 사람(Human)을 배우자.'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기까지, 사실 꽤 오래 걸렸다. MBA라는 선택지는 당시 내 또래에게 일종의 '정답지' 같은 것이었다. 그 길을 포기하는 일은 단순히 학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온 커리어의 지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더 무겁고, 그래서 더 오래 고민했다.
2013년, 결혼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던 그해,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MBA 대신 교육대학원에 가고 싶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졌어."
고맙게도 남편은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나는 서른이 넘은 나이에, 익숙한 명함을 내려놓고 낯선 '교육공학'의 길을 선택했다.
대학원에 가보니 동기들은 대부분 정통 HRD(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이었다. 브랜드 컨설팅과 마케팅을 하다가 온 나는 그들 사이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처음엔 그 낯설음이 두려웠다.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다름'이 축복임을 깨달았다.
기존의 HRD 담당자들이 "어떻게 교육 내용을 잘 전달할까?"를 고민할 때, 나는 "어떻게 이 가치를 매력적으로 '설득'할까?"를 고민했다. 교육학의 깊이 있는 이론에 마케팅의 유연한 화법을 섞자, 딱딱했던 조직문화가 말랑말랑한 스토리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블렌딩'은 단순히 두 가지를 섞는 게 아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도 같다.
마케터로서의 '감각'이 조직문화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대학원에서 배운 '이론'은 그 안에 단단한 뼈대를 세워주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실전을 경험하고, 밤에는 대학원에서 원리를 파고들었던 그 이중생활.
그것은 내 커리어에서 가장 고단했지만, 가장 밀도 높게 성장한 시간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느꼈던 '한계'와 '좌절'이 참 고맙다. 만약 내가 마케팅 기술만으로 조직문화를 성공시켰다고 착각했다면, 나는 평생 겉만 번지르르한 '행사 기획자'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 다시 배우기를 선택한 순간, 내 커리어는 비로소 '깊이'를 가지게 되었다.
[래비가 제안하는 커리어 블렌딩 질문]
STEP 1. [Expansion] 본업 밖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는가?
-내 커리어의 결정적 기회는 종종 R&R 바깥에 있다. 나는 주어진 일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손을 들고 있는가?
-[질문]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내 가슴을 뛰게 하거나 호기심이 생겨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TFT)'는 무엇인가?
STEP 2. [Connection] 낯선 영역에 내 강점을 이식했는가?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할 때, 맨땅에 헤딩할 필요는 없다. 내가 가장 잘하는 무기를 가져와 낯선 땅(HR)에 적용해 보는 시도가 곧 '블렌딩'의 시작이다.
-[질문] 내가 가진 핵심 역량(나의 무기)은 무엇이며, 이것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분야에 접목한다면 어떤 재미있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7화 예고]HRD 전문가들 사이에서 '마케팅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때론 훈장이었고, 때론 멍에였다. 하지만 그 '다름' 덕분에 나는 조직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렇게 학교와 회사,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뛰어가던 어느 날, 덜컥 세 번째 토끼가 찾아왔다. 뱃속의 '쌍둥이'였다. 졸업 논문 심사를 앞두고 찾아온 임신성 고혈압. "산모님,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공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링거를 꽂은 채 고민했던,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던 엄마이자 학생 래비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 칼럼니스트 '래비(LABi)'는 사람과 조직의 성장을 고민하는 코치이자 교육·문화 담당자입니다. 20년의 치열한 실무 경험과 워킹맘의 일상을 재료 삼아, 지나온 모든 순간이 어떻게 현재의 나로 '블렌딩'되는지 그 성장의 기록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