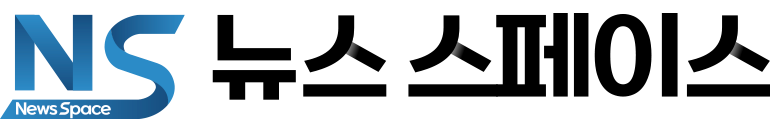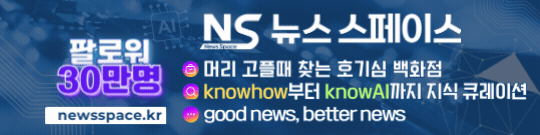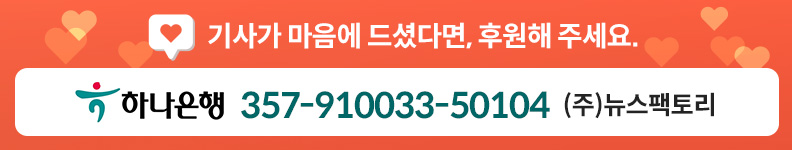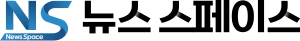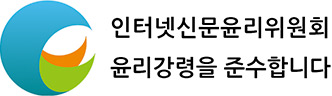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단지 ‘부두’라는 단어의 차용 때문만은 아니다. 이 노랫말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심수봉의 애잔한 목소리가 영화의 OST처럼 뇌리를 스쳤다.
‘부.두.아.’
제목만 봤을 때, 그리고 처음 접했을 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은 흥미로웠다. 다만 ‘재미있겠다’보다는 ‘이게 뭐지?’에 더 가까웠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심리학 박사는 아니지만 인간 본연의 감정을 건드리는 가스라이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스스로 진화하는 괴물이 되어가는 인물. 그녀가 바로 주인공 신혜선이 연기한 ‘두아’다.
마지막 질문은 많은 생각을 남긴다.
(*사실 그녀가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보는 내내 인지하게 되지만, 마지막 8화에서 그녀의 변론(?)을 듣고 나면 생각이 한순간 혼미해진다.)
“이름이 뭐예요?”
무명씨도 있지만, 모든 이에게는 이름이 있다. 사람뿐 아니라 사물조차 그렇다.
기독교 신자로서 운명을 믿는다고 말하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나는 태어난 팔자, 숙명(여기서는 명운까지 포함해)을 어느 정도 믿는 편이다.
매회 1시간을 넘지 않는 총 8부작. 올 설 연휴 안방을 ‘후끈’ 달구는 작품이라고까지 말하긴 어렵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이었다.
◆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는 것
뒤로는 욕하면서도, 앞으로는 사고 싶은 것. 바로 ‘명품’이 아닐까. 물질만능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욕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사고 싶어 하는 분위기에 더 가깝다.
돈이 있어도 기존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려고 가도 줄을 서야 구경조차 가능하고,
별것 아닌 듯해도 입는 순간, 드는 순간, 차는 순간 남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물건.
바로 ‘명품’이다.
밑바닥까지는 아니지만, 소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저층에서 발버둥 치며 상층으로 올라가려는 그녀의 모습은 안쓰러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철저한 의도와 연출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성큼성큼 나아가는 도발적 캐릭터. 누가 봐도 사기 행각의 연속이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인물.
그녀가 바로 ‘두아’다. 그리고 그녀의 산물이 ‘부두아’다.
주말마다 즐겨 보는 지상파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바로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오죽하면 아직도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서프라이즈다.
마치 그 프로그램에 등장할 법한 이 이야기는 조금 식상해 보이기도 하고, 다소 어설퍼 보이기도 하지만, 설 연휴의 포문을 여는 작품으로서 소파에 앉아 보낸 시간이 아깝지는 않았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는 말이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 작품을 보며 우리 삶과도 묘하게 겹쳐 보였다.
◆ 과유불급… 멈출 줄 알아야
다시 코칭 이야기다.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후회가 됩니다.”
가속 후 브레이크를 밟기보다, 오히려 더 페달을 밟다가 결국 사단이 나는 경우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상황에 취하고 욕심을 더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주 평범한 진리.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을 다시 곱씹게 된다.
유명무실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나’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to be continued)
P.S. 문근영을 닮았다는 평가를 받던 연기 잘하는 배우 신혜선의 첫인상이, 이제는 ‘신혜선’이라는 이름 석자로 또렷이 자리 잡은 느낌이다. 그녀가 출연한 거의 모든 작품이 인상 깊었다. 마지막 반전은 다소 서두른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마무리 덕분에 오히려 이 작품이 더 또렷하게 기억되는 것 같기도 하다.
* 칼럼니스트 ‘올림’은 건설,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소재·화학, IT, 패션 등 다양한 업계를 거쳐온 홍보전문가입니다. 인증코치이기도 한 그는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미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