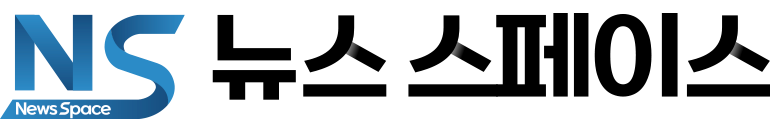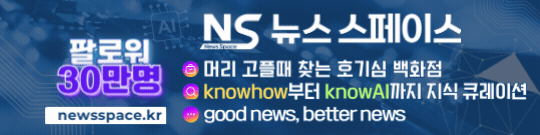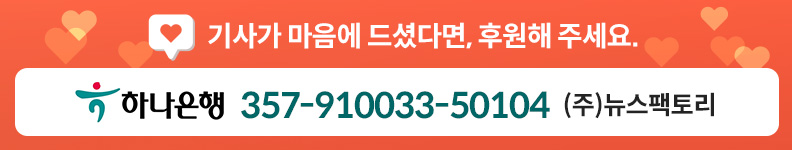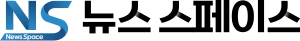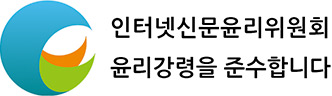설 연휴 동안 가족과 호캉스를 즐기고, 전시도 보고, 근사한 식사도 했지만, 틈틈이 업무를 놓지 못한 탓인지 몸과 마음이 제법 지쳐 있었다. 그렇게 금요일을 간신히 버텨낸 뒤, 퇴근길에 첫째 학원 픽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를 켰다.
늘 그렇듯, 화면 한켠에 신작이 눈에 띄었다. 〈파반느〉. 제목의 뜻은 차치하고, 원작이 소설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동했다. 그렇게 120분이 채 되지 않는 ‘착한 러닝타임’에 몸을 맡겼다.
이 영화는 청춘 성장기라 쓰고, 어쩌면 ‘루저들의 이야기’에 가깝다. 대단한 반전도, 충격적인 결말도 아니다. 그저 보고 있노라면 은근히 따뜻해지는, 모닥불 앞에서 툭툭 튀는 불씨를 바라보는 듯한 감정에 가깝다. 다만 요한이라는 인물이 맞닥뜨리는 성공의 전개는 다소 급작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관객을 결말로 끌고 가기 위한 서사의 속도가 조금은 서두른 인상이다.
주연 배우의 우수 어린 눈빛 연기는 인상적이다. 〈미생〉 속 임시완이 떠오를 만큼, 촉촉하고 여린 표정 연기가 영화의 정서를 잘 받쳐준다. 다만 ‘원톱 스타’가 주는 존재감의 무게는 여전히 느껴진다. 작품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대중에게 각인된 얼굴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된다.
고아성은 역시 고아성이다. 화려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외형이지만, 그 ‘평범함’을 연기로 덮어버리는 배우다. 배두나가 떠오르는 지점도 있다. 튀지 않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얼굴과 연기. 그 보통성을 무기로 만드는 언더커버 같은 연기에 박수를 보낸다.
변요한은 ‘딱 변요한’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자기만의 연기 톤과 개성. 그래서 익숙하고,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관객이 기대하는 이미지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점이 장점이자 한계로 느껴진다.
분주한 평일을 겨우 버텨낸 뒤, 주말 문턱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보기 좋은 힐링 무비로는 제격이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영화다.
◆ 청춘을 바라보는 나쁘지 않은 시각
영원할 것 같지만 찰나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착각이기도 한 시기.
청춘은 늘 가능성과 도전으로 상징되지만, 현실은 종종 좌절로 끝난다. 영화 속 청춘 역시 마찬가지다. 꿈을 꾸고, 벽에 부딪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영화는 환상이 아니라 ‘상상’의 언어로 청춘을 말한다.
최악으로 치닫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타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인 청춘의 초상이다. 그 시선이 나쁘지 않았다.
◆ 딱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코칭 과정에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나 역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던져왔다.
문과였던 나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과로 진학해 약사가 되는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좋고, 작지만 나만의 공간에서 일하는 삶에도 매력을 느낀다. 사회적 역할과 생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맞물리는 직업이라는 점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어느덧 지천명. 불혹을 넘어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에 이르렀다. 이제 나는 거창한 꿈보다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고, 가족이 무탈하고, 삼시 세끼를 챙길 수 있는 일상이 감사한 ‘현실적 협상가’에 가깝다.
여전히 청춘인 당신에게.
“지금 아니면 못 한다”는 말도 맞고,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못 하게 된다”는 말도 사실이다. 그러니 일단 해보시라. 실패해도 괜찮은 시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P.S. 소설이 영화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곱씹어볼 만한 문장과 대사가 여러 번 마음에 남았다. 그것만으로도 이 작품을 만난 보람은 충분했다.
* 칼럼니스트 ‘올림’은 건설,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식음료, 소재·화학, IT, 패션 등 다양한 업계를 거쳐온 홍보전문가입니다. 인증코치이기도 한 그는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미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