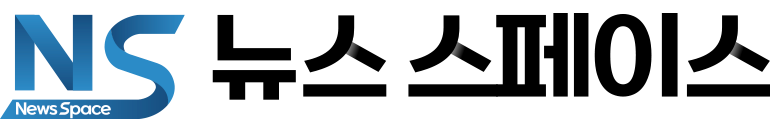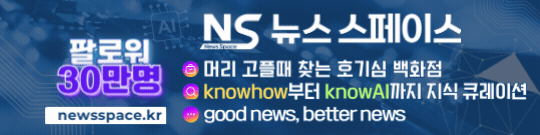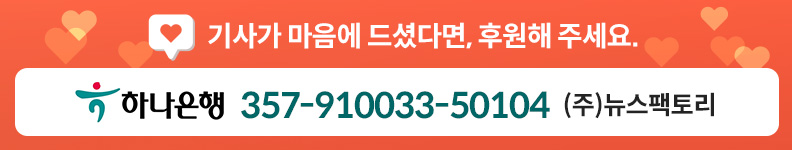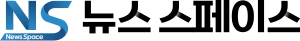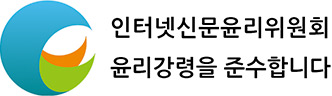1. 실패를 나만의 무기로 바꾸는 법
"코치님, 지난 회사에서 했던 일은 지금 직무랑 너무 달라요. 뒤죽박죽 물경력이 될까 봐 걱정됩니다."
커리어 코칭을 하다 보면 꽤 자주 듣는 이야기다. 분명 치열하게 살았지만, 지금 하는 일과 연결고리가 없어 보여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이나 '낭비'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커리어 블렌딩'의 관점에서는 다르다. 쓴맛이 나는 에스프레소가 우유를 만나 고소한 라떼가 되듯, 쓰라린 실패의 경험도 현재의 직무와 섞이면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강점이 된다. 나에게는 대학 시절 20대 초반, '인턴과 대학생 기자' 시절이 바로 그 쓴맛 나는 에스프레소였다.
2.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다: '관찰자'와 '공감자' 사이
대학 3학년 겨울, 친구가 건넨 한 장의 공고는 내 인생의 첫 번째 '블렌딩 재료'가 될 줄 몰랐다.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지원해 봐."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치열함을 견뎌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글을 쓰는 직업'이라는 막연한 동경만으로 나는 원서를 냈다.
필기시험 작문 주제는 '들풀'이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많은 지원자가 들풀의 끈질긴 생명력을 정치 상황이나 민중의 삶에 빗대어 썼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 토박이인 내게 들풀은 거창한 이념이 아닌, 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이었다.
"할머니, 이건 잡초야?" "아니여, 잡초가 어딨냐. 들에 핀 꽃도 다 저마다 이름이 있는 법이여."
나는 거창한 메타포 대신, 작고 소외된 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던 할머니의 시선을 그대로 글로 옮겼다. 아마도 심사위원들은 예비 기자들의 비장한 글 사이에서, 소외된 작은 풀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내 글을 신선하게 봐주셨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덜컥 신문사의 인턴 기자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의 '사회부 기자'는 달랐다. 아이들 실종 사건 발생 후 주검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다. 선배는 내게 "장례식장에서 아이의 일기장을 확보해라.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기자의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당시 어린 나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오열 앞에서 나는 '취재원'을 찾는 냉철한 관찰자가 될 수 없었다. 그저 같이 울고 싶은 공감자일 뿐이었다.
비슷한 시기 마약 거래 현장을 포착해 직접 취재를 시도했던 무모한 사건도 있었다. 범인을 잡고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정의감에 도전했지만 두려움이 앞서 주저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기록 하는 기자의 역할에 매력을 느끼기 보다는, 직접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내 안의 욕구가 더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선배들은 "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아. 기자로서 딱 맞아"라고 격려해 주었지만, 열정과 의지만으로 버티기에 기자의 옷은 내게 맞지 않았다. 술과 담배로 정보가 오가는 당시의 거친 문화도 경험 없는 내겐 버거웠다. 인턴 기간이 끝나고 대학생 기자로까지 경력을 이어가며 노력했지만, 결국 나는 기자의 길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한동안은 패배감에 시달렸다. 내가 좋아한다고 믿었던, 글로 밥을 벌어먹는 일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뼈아팠다. "나는 끈기와 용기가 부족한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다. 이력서에 남은 건 '인턴/대학생 기자'라는 짧은 한 줄뿐, 남은 게 없다고 생각했다.
3. 실패의 재해석: 버릴 경험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나 한 기업의 HRD를 총괄하고있는 나는 지금, 그때의 실패를 이렇게 '블렌딩'하고 있다.
*따뜻한 시선 (Humanity): '들풀'을 소중히 여겼던 그 감수성은, 성과 뒤에 가려진 구성원의 마음을 챙기는 '조직문화 관리'의 핵심 역량이 되었다.
*공감 능력 (Empathy):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괴리감은, 구성원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상담하는 '인권 경영'과 '코치'로서의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다.
*정의감과 실행력 (Integrity): 무모해 보였던 잠입 취재의 정의감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문화를 만드는 '변화 관리'의 동력이 되었다.
*위기 대응 (Risk Management): 험한 사회부 현장에서 배운 감각은, 인권 이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소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기자로서의 나는 도전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그 경험은 HRD 전문가로서 나에게 '남들은 갖지 못한, 현장성과 기동성을 갖춘 전문가'라는 독특한 향을 입혀주었다.
4. 당신의 과거 '경험'을 지금의 '핵심 역량'으로 블렌딩하는 법
지금 당신의 이력서에서 지우고 싶은 '실패한 경험' 혹은 '물경력'이 있는가? 그것을 버리지 말고, 오늘의 나를 위한 재료로 써보면 어떨까.
지금부터 래비가 제안하는 <커리어 블렌딩 3단계 질문>을 따라가 보자.
STEP 1. [Fact] 그 경험은 왜 실패했는가? (나의 성향 발견)
단순히 "내가 못해서"라고 자책하지 마라. 그때 내가 느꼈던 '불편함' 속에 나의 진짜 '직업적 가치관'이 숨어 있다.
[워크시트]
나는 [_______] 상황에서 [_______] 감정을 느꼈다. 그건 내가 [_______]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나는 팩트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보다, 직접 개입해서 사람을 돕고 문제를 해결할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구나."
STEP 2. [Sk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재료 추출)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아주 사소한 기술이나 태도라도 좋다. 훈련받은 근육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워크시트]
그 경험을 통해 나는: [_______] 하는 법을 배웠다. [_______] 하는 습관이 생겼다 [_______] 할 때 자신감이 생겼다.
[나의 경우] “팩트 체크 습관, 현장에 바로 달려가는 기동성,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담력, 핵심을 요약하는 글쓰기 능력을 배웠다.”
STEP 3. [Blending] 지금 나의 일에 어떻게 섞을 수 있는가? (적용)
지금 하는 일(또는 하고 싶은 일)에 STEP 2의 재료를 한 스푼 넣으면 어떤 차별점이 생길지 상상해 보자.
[워크시트]
[현재/목표 직무] + [과거 경험의 재료] = [나만의 차별점]
[나의 경우] "HRD 매니저(현재) + 사회부 기자의 기동성(과거) =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고, 이슈가 생기면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소통하는 현장형 리더가 된다.”
길이 아닌 것 같아 돌아 나오는 과정조차, 훗날 당신을 설명하는 가장 단단한 서사가 된다.
지금 겪고 있는 시행착오가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훗날 더 맛있는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 숙성 중인 재료다.
들풀 같았던 나의 20대 초, 그 서툴렀던 경험의 기록이 지금은 참으로 고맙다.
[3화 예고] "기록하는 자가 될 수 없다면, 이야기를 만드는 자가 되겠다" '팩트'를 찾아 헤매던 기자의 길은 멈췄지만, 세상을 향한 나의 글쓰기는 멈추지 않았다. 무대는 신문사 편집국에서 온라인 영화 홍보사로 바뀌었다. 기자 시절, 독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고민했던 그 치열한 '헤드라인 뽑기' 실력. 과연 그 감각은 스크린 밖 마케팅 현장에서 어떻게 블렌딩되었을까?
★ 칼럼니스트 '래비(LABi)'는 사람과 조직의 성장을 고민하는 코치이자 교육·문화 담당자입니다. 20년의 치열한 실무 경험과 워킹맘의 일상을 재료 삼아, 지나온 모든 순간이 어떻게 현재의 나로 '블렌딩'되는지 그 성장의 기록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