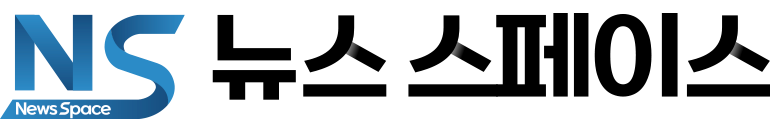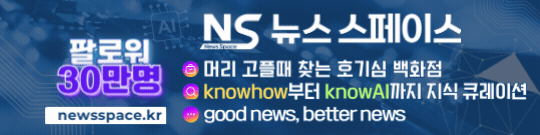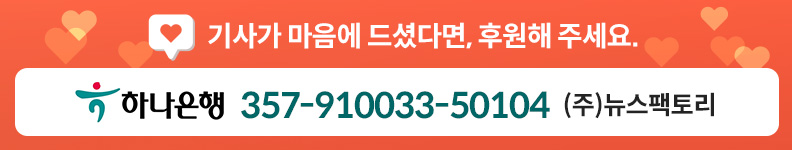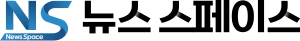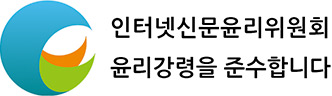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미국 국무부가 최근 전 세계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 하달한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이 있는 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미국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 지침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공공복지 의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국 사회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우려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의 심각성에 따른 장기 의료비용 발생 가능성이 비자 심사 기준의 핵심 요소가 됐다.
이번 지침은 심혈관, 호흡기, 대사, 신경계, 정신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 등을 포함하며, 특히 비만과 당뇨가 미국 내에서 성인 인구의 주요 만성질환임을 감안해 이들의 비자 심사 비중이 크게 강화됐다. 미국 내 비만 인구는 1억명 이상이며, 비만은 암 발생의 약 40%와 관련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성인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어 해당 질환으로 인한 비자 발급 제한은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가 치료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만성질환 여부도 심사에 반영된다. 가족 중 질병이나 장애자가 있어 신청자가 고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자 발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엄격해진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하며, 비자 심사 시 건강 요인의 비중 확대가 즉시 시행될 경우 심사 절차 복잡성과 비자 발급 지연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비만과 당뇨가 사회·환경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된 점을 들어 이를 비자 자격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공중보건 문제를 이민정책에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공적 부담’ 기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장기 시설 요양 비용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영주권 및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쳐왔다. 이번 만성질환 관련 새 지침은 이 기준을 의료비 부담이 큰 만성질환으로 확대 적용하는 조치로, 장기간 미국 내 의료 복지 비용 부담 우려가 중요한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미국 이민 비자 심사에서 건강상태가 새롭게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비자 승인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서 "이는 미국 내 만성질환 증가 추세와 공공의료 재정 부담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