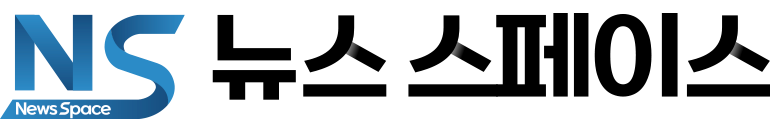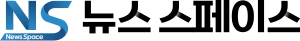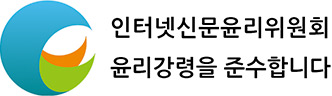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현대제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안동일 전 대표이사 등을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8월 24일 통과된 지 불과 3일 만에 대규모 집단행동이 현실화됐다.
법원·정부 판단과 노사의 주장
2021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고, 인천지법은 2022년 원청 사용자성(직접고용)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도 2025년 7월 협력업체 조합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 판결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안을 내세우며 협력업체 직고용 집행을 미뤄온 상태다.
2021년 9월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180명은 50여일간 통제센터 점거 농성을 벌였고, 이에 현대제철은 약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5년 6월 “5억9000만원만 배상하라”며 현대제철 청구액의 2.95%만 인정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쟁점
노란봉투법 통과로 교섭 대상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 미치는 사용자”로 확대되고, 쟁의행위 범주도 “경영진의 주요 결정” 등으로 넓어졌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폭력행위에 제한돼 노조의 집단 행동권이 크게 강화된다는 평가다. 이 복수 피고소사건도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해석이 직접 충돌한 사례다.
국제 사회·법조계 시사점
현대차·현대제철 불법파견 문제는 2004년 첫 고용노동부 적발, 이후 대법원 판례 등에서 꾸준히 사용자성 인정 논란이 이어졌다. 실제 포스코 등 타사에서 이미 대법 판결이 나온 불법파견 사건에서도 피해자 중심 판결, 기업 벌금(3000만원 등), 직접고용 명령 등이 빈번하게 나왔다.
최근 유엔 등 국제기구도 한국 정부에 “‘보복 소송’ 철회 및 노동권 보장”을 촉구해왔고, 이번 사건 역시 글로벌 노동권 기준과 국내 법·현실의 격차 문제를 재확인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문제와 이번 경영진 고소는 국내 노동현안, 대규모 법정 다툼, 기업 책임 및 글로벌 기준 충돌이 맞물리며 재계 전반에 신호탄을 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