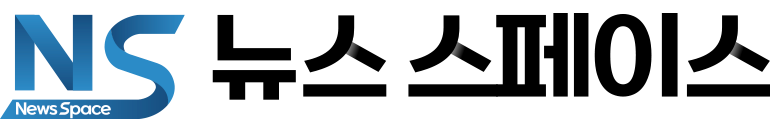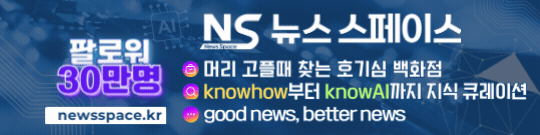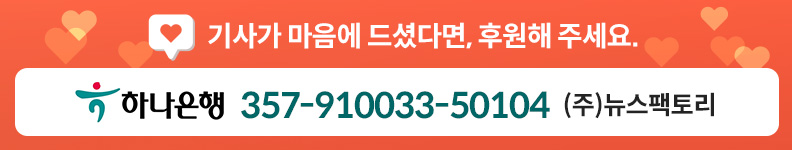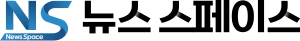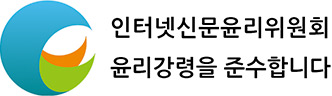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 오늘 나는 누구로 사는가?
매일 아침 7시 30분, 출근을 준비하며 옷장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나(myself)’로 세상에 나설까?
왼쪽에는 단정하게 다려둔 정장이 있다. 회의나 인터뷰가 있는 날, 이 옷을 입으면 내 안의 전문가가 깨어난다.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고, 표정도 바뀌며 단호한 나를 불러낸다.
가운데에는 티셔츠와 청바지가 있다. 특별한 보고가 없는 날, 이 옷을 입으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생각이 열린다. 동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편안한 직장인의 내가 드러난다. 아이와 함께 움직일 때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엄마로 변신하기도 한다.
오른쪽에는 운동복이 있다. 땀 흘리며 달릴 때의 활력 있고 자유로운 내가 그 안에 숨어 있다.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걸음걸이와 태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며 알게 된다.
옷은 단순한 겉치레가 아니라, 마치 나의 다양한 정체성을 꺼내어 보여주는 정체성의 옷장 같다는 걸.
그래서 코칭에서도 고객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being 질문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옷장을 탐색하도록 돕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옷이 나인지, 내가 옷인지 헷갈릴 때
하지만 옷장을 열어본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떤 옷은 오래 입어 낡았지만 익숙하고, 어떤 옷은 아직 태그조차 떼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매일 역할과 마음 사이를 오가며 서성인다.
코칭의 대화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이는 옷의 색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그 옷 안에 숨은 ‘진짜 나’를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이다.
정장을 입으면 전문가가 되고, 청바지를 입으면 유연한 동료가 되는 경험은 분명 편리하고 유용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역할이라는 옷이 너무 편안하거나 혹은 너무 무거워서 벗는 것을 잊어버리곤 한다.
회의실에서의 날카로운 '나'로 집에 돌아와 가족을 대하기도 하고, '엄마'라는 옷을 갈아 입지 못하고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면서 진짜 나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
그때 문득, 옷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나는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잃는다.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질문이 떠오른다.
'이 모든 옷을 벗어던지면, 나는 과연 누구일까?.'
◆ 옷장 문을 열며: 모든 선택이 정답인 이유
새벽 6시, 화장도 하지 않고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민낯으로 거울 앞에 선다.
그 순간 생각한다.
옷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옷을 선택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정장을 입어도, 청바지를 입어도, 운동복을 입어도 나는 여전히 ‘나’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옷 뒤에 있는 변하지 않는 나다.
결국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옷을 고르는 ‘나’인 셈이다.
코칭도 마찬가지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를 탐색하고 그 모든 나를 품으며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 아닐까.
★ 칼럼니스트 ‘래비(LABi)’는 어릴 적 아이디 ‘빨래비누’에서 출발해, 사람과 조직, 관계를 조용히 탐구하는 코치이자 조직문화 전문가입니다. 20년의 실무 경험과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을 돕는 작은 연구실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