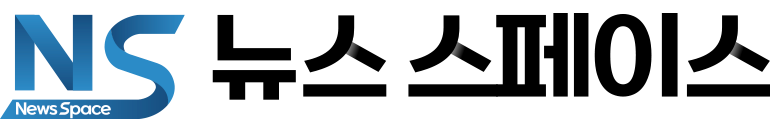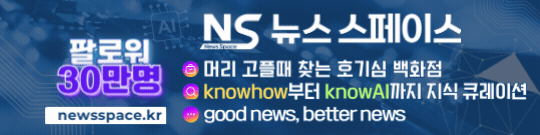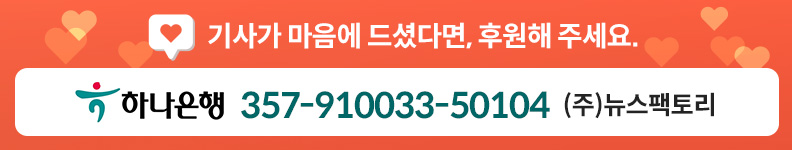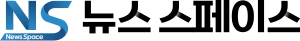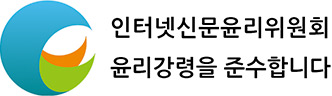삶의 연륜이 쌓이면 치울 건 치우고 버릴 건 버려야 하는데....
미련 많은 중년 아재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잡동사니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저 때에 맞게 처리하지 못한 것뿐인데, 이게 가끔 복고주의와 맞물려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사람의 취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집에 남아 있는 VCR 기기와 약간의 비디오테이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봐야지’ 하고 구했다가 제대로 재생한 적 없는 게 대부분이지요. 읽을 책을 사는 사람(독서광)과 책을 먼저 사두고 읽는 사람(도서광)의 차이랄까요?
가끔 오래전 특정 작품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TV 수납장을 정리하다가 눈에 들어온 <터미네이터 3: Rise of the Machines>가 그랬습니다. 앞선 두 편을 정말 재미있게 관람했는데, 이 작품은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개봉했습니다. 당시 평가가 좋지 않아서 보지 않았지요.
그랬기 때문이지 제 기억 속 터미네이터는 1, 2편 이후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사실 딱히 궁금했던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수납장 속 터미네이터 3를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운명의 이끌림이랄까? 이 작품을 봐야한다는 강한 열망과 함께 손이 비디오테이프로 향해 가더군요. 이를 통해 개봉 후 20년이 넘게 걸려 다시 터미네이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스카이넷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핵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른 바 심판의 날이지요. 살아남은 인간들은 존 코너를 중심으로 저항군을 조직해 장기간의 전쟁에 나서고, 위기를 느낀 스카이넷은 살인기계 터미네이터를 과거로 보내 훗날 저항군의 싹을 없애려 합니다.

존 코너 임신 전의 엄마 사라 코너, 유년기 존 코너를 죽이려 했지만 연이어 실패한 스카이넷은 이번엔 저항군 주요 멤버와 스카이넷 운영담당 장군을 타겟으로 하지요. 이를 막기 위해 미래에서 또 다시(?) 파견된 터미네이터 방어용 터미네이터, 죽으려는 터미네이터(T-X)와 살리려는 터미네이터(T-850)의 물불 가리지 않는 하룻동안의 싸움이 전개됩니다.
추억이 되살아나는 작품이네요. 전성기 근육질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맡은 T-850 모습에 왠지 눈물이 날 듯 했습니다. 물론 2편과 동일한 터미네이터 대 터미네이터 대결 구조가 살짝 식상할 수도 있지만, 20년 만에 재회한 저에겐 식상함보다는 반가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개체로서의 살인기계가 아니라 네트워크망을 관장할 정도로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지닌 여성형 로봇이 등장했다는 점, 자동차 추격 및 화장실 대결 등 여러 액션 씬의 역동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느껴졌다는 점, 요즘 나오는 영화와 별 차이 없을 정도의 뛰어난 CG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 등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전작에서의 스토리 개연성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간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편에 나왔던 존 코너 아역 배우보다 다소 매력도가 떨어지고 클레어 데인스 역시 1996년작 <로미오와 줄리엣> 때에 비해 많이 노화된 부분은 아쉬웠지만, 작품 구성과는 상관 없는 배우를 향한 개인적 견해일 뿐이지요. 디지털 영상에 비해 덜 깨끗하지만 낭만이 서린 비디오를 기분 좋게 보며 미래에 대한 상상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 운명에 대해, 운명 앞에 선 사람의 태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에 전작 터미네이터 2편의 주제는 'No Fate, But What We Make'란 말처럼 정해진 운명은 없고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로 인해 맞이하게 될 심판의 날이란 운명도 코너 모자와 조력로봇(T-800)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가볍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력을 다해 막았음에도 심판의 날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로 미뤄진 것뿐이었지요. 터미네이터 3편 속 기나긴 하루 내내 존 코너 일행이 스카이넷의 핵 발사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심판의 날은 오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죽고, 마침내 도달한 곳이 지은지 30년 이상 지난 방공호라니… 극심한 PTSD를 겪고 부랑아로 살면서까지 인류를 지키려 애썼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운명은 거부할 수 없단 말일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스피커 저편에서 아직 살아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을 막아내야하는 존 코너는 운명 앞에 무릎 꿇었지만, 스카이넷과 맞서 싸울 저항군 대장 존 코너가 만들어갈 운명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문득 운명이란 게 이슈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쟁이에게 이슈 관리는 참 중요한 업무지요. 특히 부정적인 대상인 경우에는 사안을 확산시키지 않고 잠재우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 유명한 격언이 있지요. ‘이슈는 죽지 않는다. 다만 잠복할 뿐.'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를 이슈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게 홍보하는 사람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일을 생각하니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재는 인류 심판에 대한 흥미 있는 옛 영화를 본 기분을 조금 더 이어가려 합니다.
다음주에는 터미네이터처럼 중간에 놓쳤던 <혹성탈출>을 시청해야겠습니다. 살인기계와는 다른 매력을 유인원을 통해 느낄 수 있겠지요? 그 작품은 비디오테이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살짝 아쉬울 따름입니다.
* ‘AZ 임부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 못한 채 자기 멋에 빠져 있는 아재로, 공대 졸업 후 전공을 바꿔 20년차 기업 홍보맨으로 근근이 밥벌이 중이다. 책과 음악, 영화, 드라마 등에 파묻혀 한량처럼 사는 삶을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