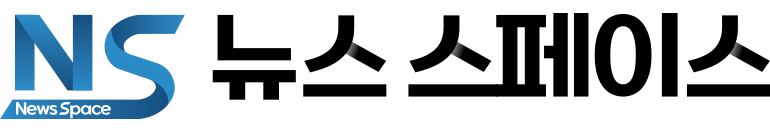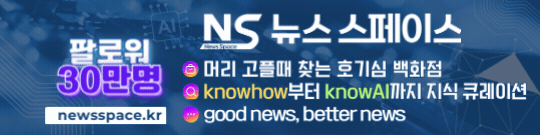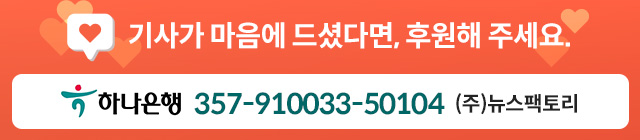![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명절맞이 선물세트로 과일을 판매중이다. [뉴스스페이스DB]](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40936/art_17252894088776_7c6769.jpg)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 '배 썩은 것은 딸을 주고 밤 썩은 것은 며느리 준다' '딸에게는 팥죽 주고 며느리에게는 콩죽 준다' '죽 먹은 설거지는 딸 시키고 비빔 그릇 설거지는 며느리 시킨다'
이 속담들은 며느리도 자식이라지만 직접 낳은 피붙이인 제 딸과 같을 수는 없다. 아무래도 며느리보다 딸을 더 위하게 되는 인지상정을 표현한 것이다. 게다가 봄가을 날씨를 통해 그만큼 가을볕이 좋다는 의미도 담고있다.
하지만 곶감에서는 '겨울 곶감 보배, 가을 곶감 찬밥'이라는 말이 어울릴 듯하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설날과 추석에는 보통 한우, 과일, 곶감 등 먹거리 선물이 세대와 시대를 불문하고 환영 받는 명절 선물의 스테디 셀러다.
명절 단골선물 곶감하면 생각나는 지역이 상주다. 전국 곶감 최대 생산지인 상주 곶감은 인지도가 가장 높아, 상주곶감의 전국 점유율이 60%에 이른다. 영동 곶감이나 동상 곶감 등의 라이벌도 있는데, 이런 곳을 비롯해 일부에서는 상주에서 감을 떼가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상주는 삼백(三白)의 고장이다. 흰 쌀, 누에고치 그리고 곶감이 유명하기 때문이다. 예전의 명성 그대로 상주 쌀은 전국 최고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토지 또한 편마암 지대로 형성된 사질양토에서 생산되어 옛부터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고품질을 자랑한다.
경북 내륙지역의 음식은 크게 내세울 게 없다. 척박한 산악지형이 대부분이어서 음식 재료가 많지 않다. 곡창지대도 적고 해산물이 나오는 바다와도 거리가 멀다. 자연히 산해진미가 다양한 다른 지역보다 음식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명절맞이 선물세트로 곶감을 판매중이다. [뉴스스페이스DB]](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40936/art_17252894120608_5af19e.jpg)
그러나 상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낙동강 상류지만, 드넓은 평야를 보유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보면 동쪽 지역은 분지이며, 북서부는 산악지역이어서 겨울의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준다. 낙동강에 합류하는 지역에 비옥한 함창평야와 상주평야가 발달했다. 게다가 맑은 날이 연평균 156일에 달해 쌀은 물론 배, 사과, 포도, 복숭아등의 과일 작물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곶감 역시 익으면서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삼백에 포함됐다. 상주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은 대체로 이름과 실상이 들어맞는다는 뜻을 가진 '명실상부'(名實相符)라는 한자어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 많다.
상주시는 1254.64㎢ 면적에 9만2778명의 인구를 가진 1읍 17면 6동으로 구성됐다. 상주시는 전국 시군구 중 6위, 경상북도에서도 안동시, 경주시 다음으로 3위일 정도로 면적이 넓다. 경상도란 이름도 당시 가장 큰 고장인 경주와 상주에서 따왔을 정도로 영남의 대표 중심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까지 오늘날의 도청에 해당되는 경상감영이 있었던 경상도의 중심지였다. 1789년 전국 도시 호구조사에 따르면 상주의 인구수는 1만8296명으로 전국 도시들 중 네번째로 많았다.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중에 경상도의 감영이 대구로 옮겨갔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스위트파크에서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판매중이다. [뉴스스페이스DB]](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40936/art_17252894063054_99fc10.jpg)
택리지(이중환 저)에서는 "상주의 다른 이름은 낙양이며, 조령 밑에 있는 하나의 큰 도회지로서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다. 북쪽으로 조령과 가까워 충청도·경기도와 통하고, 동쪽으로는 낙동강과 임해서 김해·동래와 통한다. 운반하는 말과 짐 실은 배가 남쪽과 북쪽에서 물길과 육로로 모여드는데, 이것은 무역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 지방에는 부유한 자가 많고 또 이름난 선비와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도 많다. 우복 정경세와 창석 이준 모두 이 고을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감은 상주에서 가장 보기 쉬운 과목(果木) 중 하나다. 감은 상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친숙한 과일로서 상주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시내만 벗어나면 그냥 길에 굴러다닌다. 가로수를 아예 감나무로 심어 놨을 정도.
곶감은 생감을 가공해 만드는 말린 과일(乾果), 즉 수분이 많아 잘 썩는 감을 오랫동안 두고두고 먹기 위해 만들어진 보존식품이다. 건시(乾柿)라고도 한다. 곶감의 흰 가루는 과당, 포도당, 만니톨 등 당류로 이루어져 있다. 모르는 사람은 겉이 허옇게 변한 걸 보고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는데 감의 당분이 빠져나와 굳은 것이다.
곶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릴 수 있다거나 변비 잘 걸리는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속설이 퍼져 있는데 곶감 속의 탄닌은 활성이 없어 변비를 일으키지 않는다. 곶감보다는 홍시가 배변활동에 그리 좋지 않다.
곶감의 유래는 꼬챙이에 꽂아서 말린 감이라는 어원이 유력하다. '꽂-' 어간의 한국어 어형은 '곶-'이며 옛말에선 용언의 어간이 관형사형 어미 없이 곧바로 체언을 꾸밈으로써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가 빈번했다. 한국은 곶감에 대한 문헌상 구체적인 기록은 조선 시대인 17세기 기록이 있으며 고려 시대에는 감을 먹었다는 기록만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명절맞이 선물세트로 곶감을 판매중이다. [뉴스스페이스DB]](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40936/art_17252894146285_e44d09.jpg)
감은 가을에 수확해 말리는 과정을 거쳐 설날 즈음에 상품으로 나온다. 이른바 '진짜 좋고 신선한 곶감'인 햇곶감이 설명절 전후에 나오는 셈. 이때부터 냉동시켜 잘 보관해 추석때도 판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설날엔 곶감이 귀품이지만, 가을에는 다소 선물로 피하는 경우도 있다.
덜 익은 생감의 껍질을 얇게 벗겨낸 뒤 대꼬챙이나 싸리꼬챙이 같은 것에 꿰어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건조시킨다. 수분이 1/3 정도로 건조되었을 때 속의 씨를 빼내고 손질해 다시 건조시킨다.
여기서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고 수분을 충분히 남겨두면 반건시가 된다. 수분이 많아 맛이 더 차지고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며 표면에 포도당 결정 - '하얀 가루'가 맺히지 않아 빛깔도 곱고 모양도 보기 좋아 건시보다 상품가치가 높다. 명절에 선물용으로 기획된 상품을 보면 대부분 반건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본래 곶감을 만드는 이유가 오랜 보관을 위한 것이므로 반건시는 수분이 많은 만큼 변질되기 쉬워 유통기한이 짧다. 물론 현대에는 냉장고 등 저장기술의 발달로 웬만한 보존식품들은 사실상 기호식품이 되었고 보존능력보다는 그 특유의 맛에 의의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
![전래동화 곶감과 호랑이에서의 이미지 때문에 곶감은 호랑이의 천적으로 인식된다. [뉴스스페이스DB]](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40936/art_1725289665504_8e5dc8.jpg)
한국에서는 전래동화 '곶감과 호랑이' 이미지 때문에 호랑이의 천적으로 인식된다. 90년대 SBS 호기심 천국에서 '호랑이는 정말 곶감을 무서워할까?'라는 주제로 호랑이들에게 곶감을 주는 실험을 했다. 먼저 그냥 곶감을 집게로 집어 우리에 넣었을 때 호랑이들이 냄새를 맡다가 곧바로 관심을 접었다.
두 번째는 사육사 손을 통해 먹이려고 했지만 질색하면서 곶감에서 고개를 돌렸다. 세 번째는 호랑이 먹이인 생닭 뱃속에 곶감을 넣어서 먹였을 때 닭을 잘 먹던 호랑이가 곶감을 씹자마자 잘 먹던 닭도 토해냈다.
아무래도 고양이과 동물들은 단 맛을 못 느끼는 만큼 단 맛이 나는 과일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 게다가 곶감은 동물들 입장에선 신선하다고 느낄 수 없는 음식이니 토해낼 만큼 기피하는 듯 하다. 반면 단 맛을 좋아하는 개과 동물들은 무척 좋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