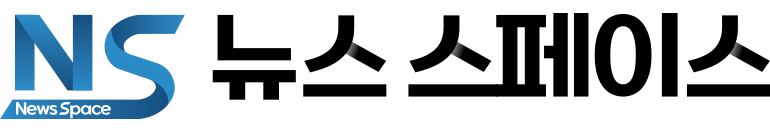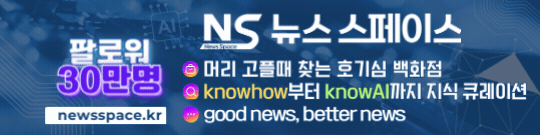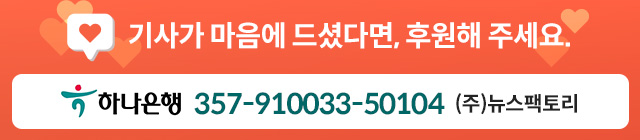[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117년 만의 폭염, 페트병 속에 갇힌 서울의 여름”
7월 8일, 서울의 낮 기온이 37.1도까지 치솟으며 1907년 근대 기상 관측 이래 7월 상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17년 만에 깨진 신기록, 그야말로 ‘서울이 펄펄 끓는 날’이었다.
“이 더위, 차라리 페트병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한강변, 도심, 해변… 어디를 가도 숨이 턱 막히는 폭염 속에, 해변에 버려진 투명 페트병 하나가 눈길을 끈다. 그 뒤로는 흐릿하게 네 명의 사람이 줄지어 걷거나 뛰고 있다. 사진 속 장면은 마치 “이렇게 더운 날엔 차라리 페트병 속에 들어가 시원하게 피서하면 어떨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자극한다.
페트병이 거대한 투명 방공호가 되고,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 더위를 피하는 듯한 착시. 현실에선 불가능하지만, 오늘 같은 날씨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봤을 법하다.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서울이 ‘찜통’이 된 이유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6분, 서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이 37.1도를 기록했다. 이는 1939년 7월 9일 36.8도를 넘어선, 7월 상순 기준 117년 만의 신기록이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에 열기를 더하는 ‘푄 현상’이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꼽힌다.
“페트병 속 피서”가 던지는 위트와 메시지
사진의 위트는 단순한 유머를 넘어,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던진다. 해변의 플라스틱 병은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환경오염의 상징이기도 하다. 오늘처럼 뜨거운 날, 페트병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상상은 곧 우리가 만들어낸 플라스틱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찜통 서울, 작은 실천이 자유를 만든다”
오늘 서울은 페트병 속보다 더 뜨거운 도시가 됐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처럼, 우리는 언제든 그 병을 벗어나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 올여름, 해변이나 공원에서 페트병 하나라도 주워보는 작은 실천이, 더 시원하고 자유로운 내일을 만든다.